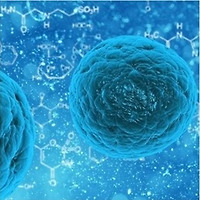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이뤄져 있다. 몸이 있고, 생각과 느낌이 있다. 생각과 느낌, 마음이 정신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움직여야 한다. 운동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등산을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많다. 오죽하면 산에 가면 죽어가던 사람도 산다고 해서 '산'이라고 했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신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까, 나는 단연코 글을 쓰라고 권한다. 글을 써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정리되고 발전한다. 늘 전신이 살아 있다. 또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 글로써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면 그 자체로 위로를 받는다.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런데 몸의 건강을 돌보는 등산과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글쓰기는 서로 닮아 있다. 산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한발 한발 올라야 한다. 한걸음에 날아오를 수 없다. 글도 마찬가지다. 한자 한자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산과 글은 공평하다. 제 아무리 용쓰는 제주가 있어도 한 걸음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 사람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차이 날 뿐, 도중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정상에 오른다. 글도 쓰면 써진다. 글을 어떻게 써야 잘 쓰냐고 물었을 때, 누군가 그랬다. 한자 한자 쓰라고.
산을 오르다 보면 그만 두고 싶을 만큼 힘든 고비가 한 두번 온다. 글쓰기도 그렇다. 도저히 못 쓸 것 같은 깔딱고개를 만난다. 산에서 깔딱고개를 만났을 때는 쉬어가는게 맞다. 자칫하면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듯이 다시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도 고비를 만나면 글과 억지 씨름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시 글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돌파구가 생긴다. 산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오르막의 탄식과 내리막의 환희 모두 하수다. 오르막에서는 내리막을 기대하며, 내리막에는 오르막을 대비하며 평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도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끙끙 앓다가 술술 써지기도 하는 게 글이다. 막힐 때 좌절해서도, 잘 써질 때 자만해서도 안된다.
산에 오를 때는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한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눈 여겨 보는 세심함과 함께, 전체 풍광을 조망하는 눈을 겸비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히 산을 즐길 수 있다. 글 역시 어휘력이나 표현 능력도 필요하지만 글의 전체 얼개를 짜는 구성 역량이 필요하다.
좋은 글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도 훌륭하고, 전체 숲의 짜임새도 좋다.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다. 산행 도중에 이정표도 봐야 한다. 글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긴 글은 개요를 짜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또한 읽는 사람을 위해 중간제목을 달아주는 친절함도 필요하다.
오를 때는 힘들지만 오르고 나면 뿌듯하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오르면 더 뿌듯하다. 글도 그렇다. 누구도 산을 대신 올라줄 순 없다. 글쓰기도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고독한 작업이다. 간혹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르듯이 남의 글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빠르고 힘은 안 들지만 보람과 기쁨이 없다. 사고가 나면 십중팔구 사망이다. 산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맞는 산의 높이가 있다. 글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저 쓰면 된다. 글에는 정답이 없다. 자기가 쓰는 것이 정답이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글도 처음으로 돌아가 복기해야 한다. 동행하는 벗이 있으면 덜 힘들다. 가벼운 술 한 잔은 힘을 내게 한다. 마주 오는 사람이 ‘수고하세요.’라며 격려하면 더 힘이 난다. 글쓰기도 꼭 그렇다. 꽃과 풀 내음은 등산에 활력소가 된다. 글을 쓰다 지치면 책을 읽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게 상책이다.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체력이다. 글도 기교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며 진정성 있는가에 달려 있다. 글을 잘 쓰려면 잘 살아야 한다. 정상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사방으로 전체 산의 모습이 보인다. 글도 다 쓰기 전까지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며, 캄캄한 방에서 출구를 찾아 암중모색하는 과정이다.
산 한번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 없다. 누구나 산에 관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산도 얕잡아 보면 당한다.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다. 글도 마찬가지다. 얕잡아볼만한 글은 없다. 아무리 짧은 글도 쓰기 쉽지 않다. 또한 잔뿌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사소한 오탈자 하나가 글을 망친다. 산에 많이 올라 본 사람이 잘 오른다. 글도 많이 써본 사람이 잘 쓴다. 글쓰기를 강연이나 글쓰기 책으로 배울 수 없다. 글쓰기는 글을 써야 배울 수 있다. 쓰는 게 글쓰기의 왕도다. 하산을 잘해야 한다. 글도 쓰는 것보다 고치는 게 중요하다. 잘 쓴 글은 없다고 했다.
잘 고쳐 쓴 글만 있을 뿐, 욕심을 버려라. 산도 글도 욕심이 문제다. 고은 시인의 시 "내려 갈 때 보았네. 올라 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꽃이 보인건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도 잘 쓰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잘 쓴다. 당신은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다. 시인이나 소설가처럼 쓸 필요 없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자신 있게 써라.
글/강원국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건강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줄기세포 치료, "알고 하세요!" (0) | 2015.06.01 |
|---|---|
| 메르스, 지나친 걱정은 말되 예방책은 숙지해야 (0) | 2015.05.28 |
| 제2의 심장, 종아리를 주물러라 (0) | 2015.05.26 |
| 잠에서 깨니 몸에 마비가? 꿈나라 불청객 '가위눌림' (0) | 2015.05.20 |
| 봄철 나들이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0) | 2015.05.19 |